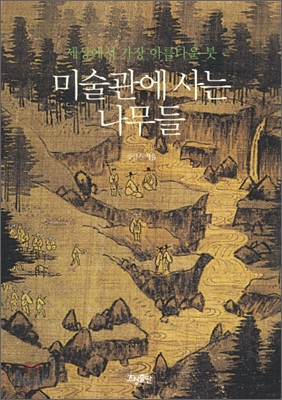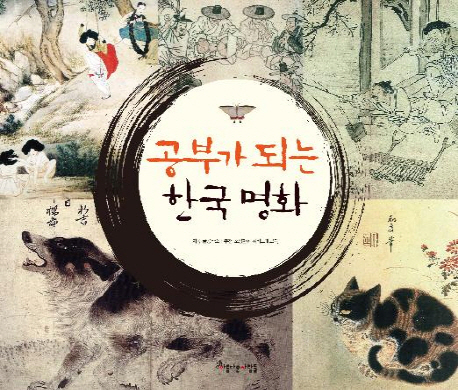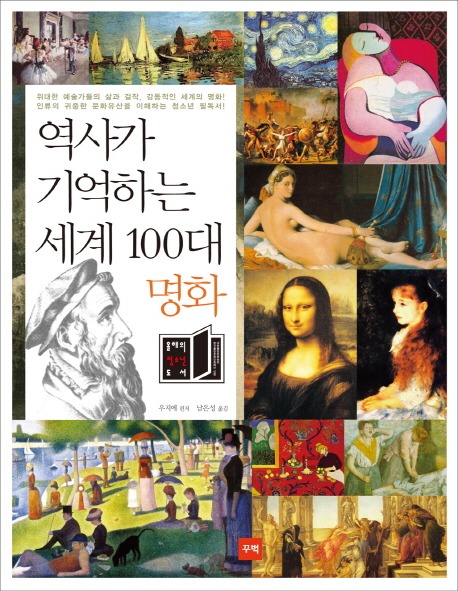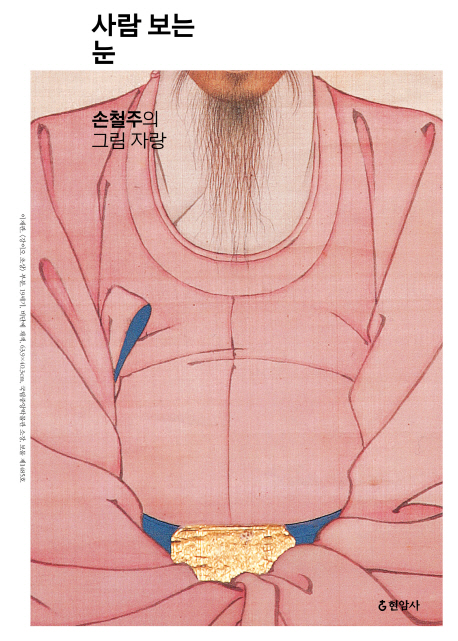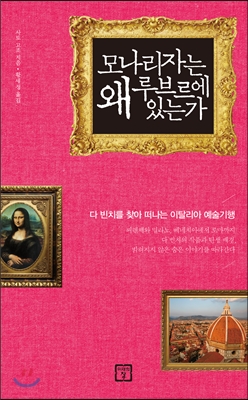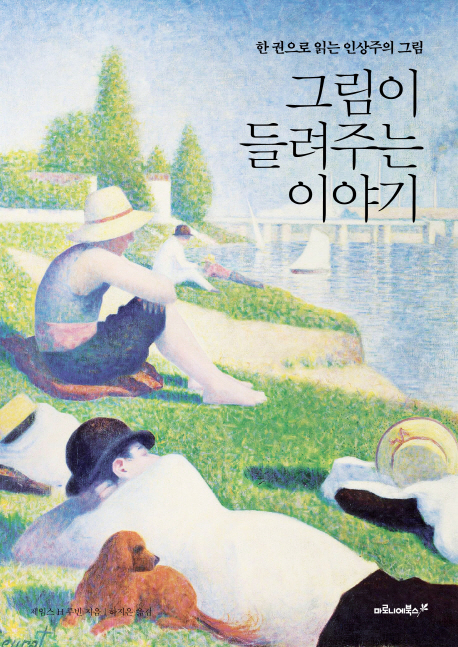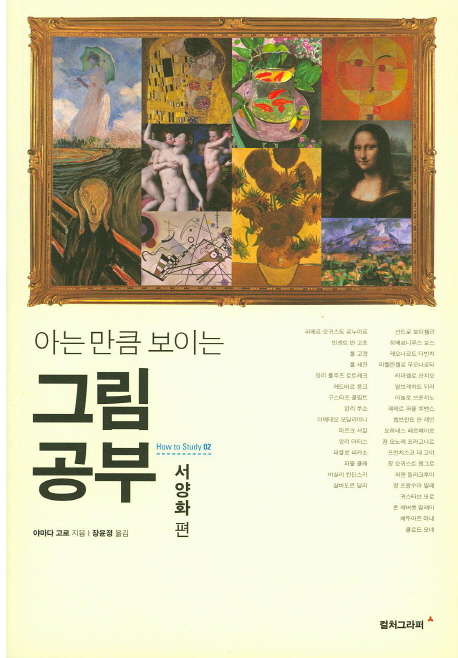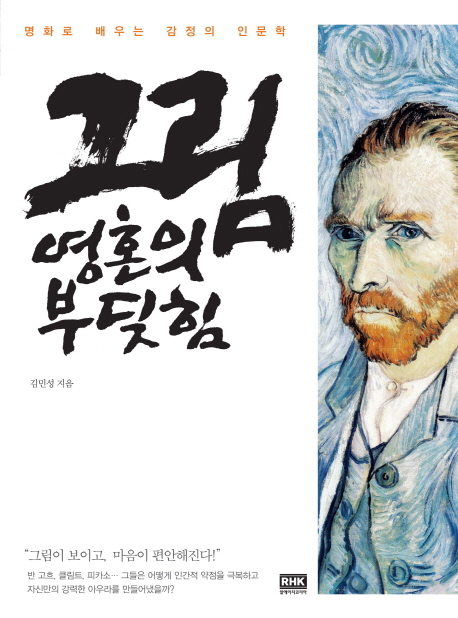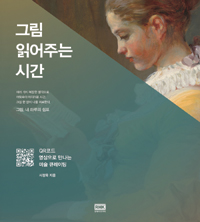신착도서
-

-
그림, 문학에 취하다 : 문학작품으로 본 옛그림 감상법
발행연도 - 2011 / 고연희 지음 / 아트북스-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0322
- ISBN 9788961960755
- 형태 355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예술 > 회화, 도화 > 시대별 및 국별 회화
- 카테고리분류 인문 > 서지/출판 > 책읽기/글쓰기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그림의 바탕이 된 문학작품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친절하게 해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책이다. 옛 그림을 감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한시문을 자세히 풀이하면서 옛 그림의 숨은 뜻을 밝혀주고, 거기에 오늘의 시각까지 곁들여 풍성한 옛 그림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책머리에 | 그림이 된 문학에서 시절의 속내를 읽다
一. 떠오르는 시정
첫 번째 그림+시. “빈산에 사람 없고,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최북의 「공산무인도」와 소식의 「십팔대아라한송」
두 번째 그림+시. “구름 짙어 어딘지 알 수 없네”
장득만의 「송하문동자도」와 가도의 「심은자불우」
세 번째 그림+시. “돌은 말을 못하니 가장 맘에 드네”
강세황의 「수석유화」와 육유의 「한거자술」
네 번째 그림+시. “신선집 개가 구름 사이에서 짖네”
허필의 「두보시의도」와 두보의 「등왕정자」
다섯 번째 그림+시. “우연히 산노인을 만나면……”
이인문의 「송하한담도」와 왕유의 「종남별업」
二. 삶을 위로하는 문인, 배움을 권장하는 학자
여섯 번째 그림+시. 기개와 풍류의 문장가, 소식
안견의 전칭작 「적벽도」와 소식의 「적벽부」
일곱 번째 그림+시. 떠나가는 지식인, 도연명
전기의 「귀거래도」와 도연명의 「귀거래사」
여덟 번째 그림+시. 은일자의 술과 자유, 도연명
정선의 「동리채국」·「유연견남산」과 도연명의 「음주」
아홉 번째 그림+시. 높으신 주자선생
이성길의 「무이구곡도」와 주희의 「무이도가」
열 번째 그림+시. 그리운 율곡선생
김이혁·김홍도·김득신·이인문·윤제홍 등의 『고산구곡시화병』과 이이의 「고산구곡가」
三. 꿈속의 공간
열한 번째 그림+시. 왕자의 도원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발」·도연명의 「도화원기」
열두 번째 그림+시. 왕과 선비의 농촌
이방운의 『빈풍도첩』과 중국의 옛 노래 「칠월」
열세 번째 그림+시. 정원의 꿈
강세황의 「지상편도」와 백거이의 「지상편」
열네 번째 그림+시. ‘책 베개’의 소망
이재관의 「오수도」와 홍길주의 『숙수념』
四. 소리의 형상
열다섯 번째 그림+시. 가을소리
김홍도의 「추성부도」와 구양수의 「추성부」
열여섯 번째 그림+시. 소년 신선의 생황 연주
김홍도의 「송하취생도」와 나업의 「제생」
열일곱 번째 그림+시. 가야산 물소리
최북의 「계류도」와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
열여덟 번째 그림+시. 새 울음 속 인간만사
심사정의 「호취박토도」와 두보·성현·이기지 등의 제화시
五. 문인의 심회
열아홉 번째 그림+시. 실학자의 세상 인식
박제가의 「어락도」와 장주의 『장자』, 「추수」 중 ‘호상 대화’
스무 번째 그림+시. 인간사의 슬픔
김정희의 「세한도」와 김정희의 편지 「이우선에게」
스물한 번째 그림+시. 추사노인의 여유
김정희의 「불이선란」과 김정희의 「제난」
六. 명산에서 얻은 감동
스물두 번째 그림+시. 금강산 만폭동의 절경
정선의 「만폭동도」와 정철의 「관동별곡」·이병연의 「만폭동」·고개지의 ‘천암경수, 만학쟁류’
스물세 번째 그림+시. 한라산 백록담, 전설과 추억
윤제홍의 「한라산도」와 윤제홍의 「유한라산기」
七. 욕망과 인정의 굴곡
스물네 번째 그림+시. 효자와 호랑이
『삼강행실도』 중 「누백포호」의 판화도와 기문·찬시
스물다섯 번째 그림+시. 선녀와의 연애 드라마
민화 『구운몽도』 중 「석교기연」과 김만중 소설 『구운몽』 중 「소사미석교봉선녀」
스물여섯 번째 그림+시. 모란꽃과 모란그림의 차이
허련의 「모란도」와 이정봉의 모란시 두 구절
一. 떠오르는 시정
첫 번째 그림+시. “빈산에 사람 없고,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최북의 「공산무인도」와 소식의 「십팔대아라한송」
두 번째 그림+시. “구름 짙어 어딘지 알 수 없네”
장득만의 「송하문동자도」와 가도의 「심은자불우」
세 번째 그림+시. “돌은 말을 못하니 가장 맘에 드네”
강세황의 「수석유화」와 육유의 「한거자술」
네 번째 그림+시. “신선집 개가 구름 사이에서 짖네”
허필의 「두보시의도」와 두보의 「등왕정자」
다섯 번째 그림+시. “우연히 산노인을 만나면……”
이인문의 「송하한담도」와 왕유의 「종남별업」
二. 삶을 위로하는 문인, 배움을 권장하는 학자
여섯 번째 그림+시. 기개와 풍류의 문장가, 소식
안견의 전칭작 「적벽도」와 소식의 「적벽부」
일곱 번째 그림+시. 떠나가는 지식인, 도연명
전기의 「귀거래도」와 도연명의 「귀거래사」
여덟 번째 그림+시. 은일자의 술과 자유, 도연명
정선의 「동리채국」·「유연견남산」과 도연명의 「음주」
아홉 번째 그림+시. 높으신 주자선생
이성길의 「무이구곡도」와 주희의 「무이도가」
열 번째 그림+시. 그리운 율곡선생
김이혁·김홍도·김득신·이인문·윤제홍 등의 『고산구곡시화병』과 이이의 「고산구곡가」
三. 꿈속의 공간
열한 번째 그림+시. 왕자의 도원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발」·도연명의 「도화원기」
열두 번째 그림+시. 왕과 선비의 농촌
이방운의 『빈풍도첩』과 중국의 옛 노래 「칠월」
열세 번째 그림+시. 정원의 꿈
강세황의 「지상편도」와 백거이의 「지상편」
열네 번째 그림+시. ‘책 베개’의 소망
이재관의 「오수도」와 홍길주의 『숙수념』
四. 소리의 형상
열다섯 번째 그림+시. 가을소리
김홍도의 「추성부도」와 구양수의 「추성부」
열여섯 번째 그림+시. 소년 신선의 생황 연주
김홍도의 「송하취생도」와 나업의 「제생」
열일곱 번째 그림+시. 가야산 물소리
최북의 「계류도」와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
열여덟 번째 그림+시. 새 울음 속 인간만사
심사정의 「호취박토도」와 두보·성현·이기지 등의 제화시
五. 문인의 심회
열아홉 번째 그림+시. 실학자의 세상 인식
박제가의 「어락도」와 장주의 『장자』, 「추수」 중 ‘호상 대화’
스무 번째 그림+시. 인간사의 슬픔
김정희의 「세한도」와 김정희의 편지 「이우선에게」
스물한 번째 그림+시. 추사노인의 여유
김정희의 「불이선란」과 김정희의 「제난」
六. 명산에서 얻은 감동
스물두 번째 그림+시. 금강산 만폭동의 절경
정선의 「만폭동도」와 정철의 「관동별곡」·이병연의 「만폭동」·고개지의 ‘천암경수, 만학쟁류’
스물세 번째 그림+시. 한라산 백록담, 전설과 추억
윤제홍의 「한라산도」와 윤제홍의 「유한라산기」
七. 욕망과 인정의 굴곡
스물네 번째 그림+시. 효자와 호랑이
『삼강행실도』 중 「누백포호」의 판화도와 기문·찬시
스물다섯 번째 그림+시. 선녀와의 연애 드라마
민화 『구운몽도』 중 「석교기연」과 김만중 소설 『구운몽』 중 「소사미석교봉선녀」
스물여섯 번째 그림+시. 모란꽃과 모란그림의 차이
허련의 「모란도」와 이정봉의 모란시 두 구절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1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