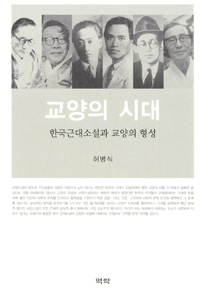신착도서
-

-
5·18과 문학적 파편들 :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재현, 그리고 계승
발행연도 - 2016 / 지은이: 심영의 / 한국문화사-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68794
- ISBN 9788968173509
- 형태 567 p. 22cm
- 한국십진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소설
- 카테고리분류 에세이/시/희곡 > 한국문학 > 한국문학의 이해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문학은 온갖 형태의 비인간적 억압과 지배, 그리고 학대에 가장 본질적으로 대항하며 인간의 소망하는 삶을 고양시키는 한편 그 목표를 인간의 해방 또는 자유의 확대에 두는 상상적 재현이다.
목차
제1부 5·18문학의 전개 양상
01 5·18문학의 의의
02 역사 혹은 기억의 재현
1. 기억의 간접화
2. 비극의 역사성
3. 기억의 현재성
4. 항쟁 주체와 민중성
03 죄의식의 표출 양상
1. 가해자의 죄의식
2.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3. 국외자(局外者)의 시선
4. 지식인의 자의식
04 트라우마의 치유 혹은 해원解寃
1. 폭력과 광기의 상흔
2. 해원(解寃) 혹은 극복
05 서사 공간의 의미망
1. 기억의 저장소
2. 소통과 응답의 공간
01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1. 5·18소설(들)
2. 기억을 말하는 자
3. 기억을 듣는 자
4. 기억을 기록하는 자
5. 행위 주체의 문제
02 상흔傷痕 문학에서 역사적 기억의 문제
1. 역사적 상흔과 문학
2. 기억의 반복과 현재화
3. 혁명과 전쟁의 성찰(省察)
4. 치유와 극복의 문제
03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1. 5·18소설과 주체의 문제
2. 항쟁 주체로서의 민중
3. 지식인의 죄의식과 머뭇거림
4.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
04 5·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1. 5·18과 여성, 여성성
2. 젠더화된 서술자, 타자로 남은 여성
3. 희생자의 기호로 남은 여성
4. 여성의 서사와 자매애적 연대
5. 새로운 집짓기
05 민주화운동에서 여성 주체의 문제
1. 여성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소설
2. 깃발을 흔드는 여성노동자의 여성성
3. 연대의 한 형태로서의 동성애적 자매애
4. 5·18 소설과 여성 주체
06 광주라는 기억 공간
1. 5월과 기억, 그리고 소설
2. 죽음과 삶이 혼재하는 장소/공간
3. 트라우마(trauma)와 죄의식의 생성 공간
4. 윤리적 분노와 저항의 공간
5. 자아/정체성의 생성 공간
07 기억과 망각 사이
1. 5·18과 문화적 기억
2. 달맞이(月神祭)를 통한 길닦음
3. 씻김굿-넋두리를 통한 해원(解寃)
4. 그러나 잊을 수 없는
08 성찰과 모색
1. 5·18 30주년의 문학적 의의
2. 기억 투쟁으로서의 5·18소설(들)
3. 새로운 5·18 소설들
4. 그러나 새로울 것 없는, 5·18소설들
5. 새로운 5·18소설의 가능성
09 오월의 기억과 트라우마, 그리고 소설
1. 기억 공간으로서의 소설
2. 기억의 서사
3. 오월의 트라우마
4. 말-소통을 넘어선 치유의 모색
5. 기억과 치유의 문제
10 5·18 문학교육의 의미
1. 5·18, 여전히, 앞으로도
2. 정서의 환기를 통한 세계 이해
3. 성장을 통한 주체의 형성
4. 공감에서 실천으로
제3부 소수자 문학들
01 다문화 소설의 유목적 주체성
1. 다문화, 폭력의 구조
2. 사랑과 감정 자본주의
3. 횡단하는 유목적 주체
4. 고통 너머로 탈주하기
02 타자로서의 장애인 문학
1. ‘장애인 문학’이라는 것
2. 대상으로서의 타자(the Other)
3. 대상에서 주체로
4. 차이로서의 장애
03 지역작가들의 변방의식과 트라우마
1. 지역문학의 위치
2. 지역이라는 골짜기
3. 변방이라는 벼랑
4. 글쓰기의 욕망
5. 경계를 넘어서기
04 영·호남지역문학에서 주체와 타자
1. 타자(the Other)로서의 문학
2. 퇴락의 이미저리(imagery)
3. 배제된 곳, 게토(ghetto)의 환유
4. 기억과 상흔(trauma)
5. 주체로서의 지역문학
05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1. 서사체의 본질- 이야기
2. 서사체의 본질- 재현
3. 이야기의 담론화 과정
4.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06 조선시대 성 담론의 정치학
1. 기억에 대한 기억(記憶)
2. 전란과 여성 피로인(被擄人)
3. 주회인(走回人)과 화냥(花孃)년
4. 정절에의 강요
01 5·18문학의 의의
02 역사 혹은 기억의 재현
1. 기억의 간접화
2. 비극의 역사성
3. 기억의 현재성
4. 항쟁 주체와 민중성
03 죄의식의 표출 양상
1. 가해자의 죄의식
2.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3. 국외자(局外者)의 시선
4. 지식인의 자의식
04 트라우마의 치유 혹은 해원解寃
1. 폭력과 광기의 상흔
2. 해원(解寃) 혹은 극복
05 서사 공간의 의미망
1. 기억의 저장소
2. 소통과 응답의 공간
01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1. 5·18소설(들)
2. 기억을 말하는 자
3. 기억을 듣는 자
4. 기억을 기록하는 자
5. 행위 주체의 문제
02 상흔傷痕 문학에서 역사적 기억의 문제
1. 역사적 상흔과 문학
2. 기억의 반복과 현재화
3. 혁명과 전쟁의 성찰(省察)
4. 치유와 극복의 문제
03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1. 5·18소설과 주체의 문제
2. 항쟁 주체로서의 민중
3. 지식인의 죄의식과 머뭇거림
4.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
04 5·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1. 5·18과 여성, 여성성
2. 젠더화된 서술자, 타자로 남은 여성
3. 희생자의 기호로 남은 여성
4. 여성의 서사와 자매애적 연대
5. 새로운 집짓기
05 민주화운동에서 여성 주체의 문제
1. 여성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소설
2. 깃발을 흔드는 여성노동자의 여성성
3. 연대의 한 형태로서의 동성애적 자매애
4. 5·18 소설과 여성 주체
06 광주라는 기억 공간
1. 5월과 기억, 그리고 소설
2. 죽음과 삶이 혼재하는 장소/공간
3. 트라우마(trauma)와 죄의식의 생성 공간
4. 윤리적 분노와 저항의 공간
5. 자아/정체성의 생성 공간
07 기억과 망각 사이
1. 5·18과 문화적 기억
2. 달맞이(月神祭)를 통한 길닦음
3. 씻김굿-넋두리를 통한 해원(解寃)
4. 그러나 잊을 수 없는
08 성찰과 모색
1. 5·18 30주년의 문학적 의의
2. 기억 투쟁으로서의 5·18소설(들)
3. 새로운 5·18 소설들
4. 그러나 새로울 것 없는, 5·18소설들
5. 새로운 5·18소설의 가능성
09 오월의 기억과 트라우마, 그리고 소설
1. 기억 공간으로서의 소설
2. 기억의 서사
3. 오월의 트라우마
4. 말-소통을 넘어선 치유의 모색
5. 기억과 치유의 문제
10 5·18 문학교육의 의미
1. 5·18, 여전히, 앞으로도
2. 정서의 환기를 통한 세계 이해
3. 성장을 통한 주체의 형성
4. 공감에서 실천으로
제3부 소수자 문학들
01 다문화 소설의 유목적 주체성
1. 다문화, 폭력의 구조
2. 사랑과 감정 자본주의
3. 횡단하는 유목적 주체
4. 고통 너머로 탈주하기
02 타자로서의 장애인 문학
1. ‘장애인 문학’이라는 것
2. 대상으로서의 타자(the Other)
3. 대상에서 주체로
4. 차이로서의 장애
03 지역작가들의 변방의식과 트라우마
1. 지역문학의 위치
2. 지역이라는 골짜기
3. 변방이라는 벼랑
4. 글쓰기의 욕망
5. 경계를 넘어서기
04 영·호남지역문학에서 주체와 타자
1. 타자(the Other)로서의 문학
2. 퇴락의 이미저리(imagery)
3. 배제된 곳, 게토(ghetto)의 환유
4. 기억과 상흔(trauma)
5. 주체로서의 지역문학
05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1. 서사체의 본질- 이야기
2. 서사체의 본질- 재현
3. 이야기의 담론화 과정
4.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06 조선시대 성 담론의 정치학
1. 기억에 대한 기억(記憶)
2. 전란과 여성 피로인(被擄人)
3. 주회인(走回人)과 화냥(花孃)년
4. 정절에의 강요
서가브라우징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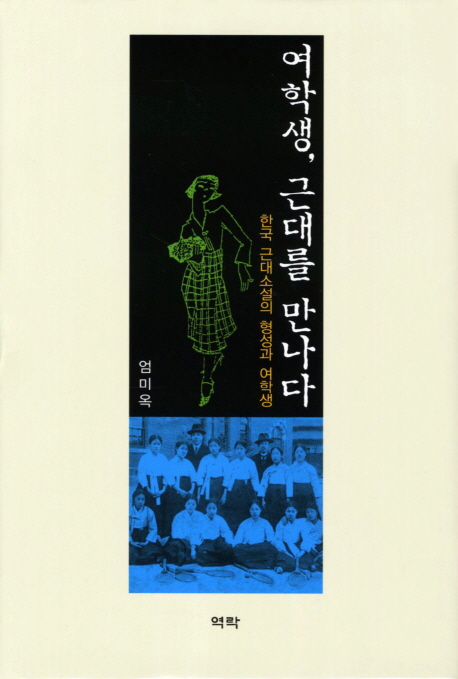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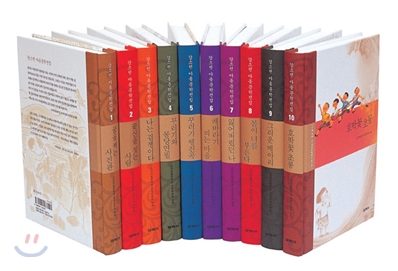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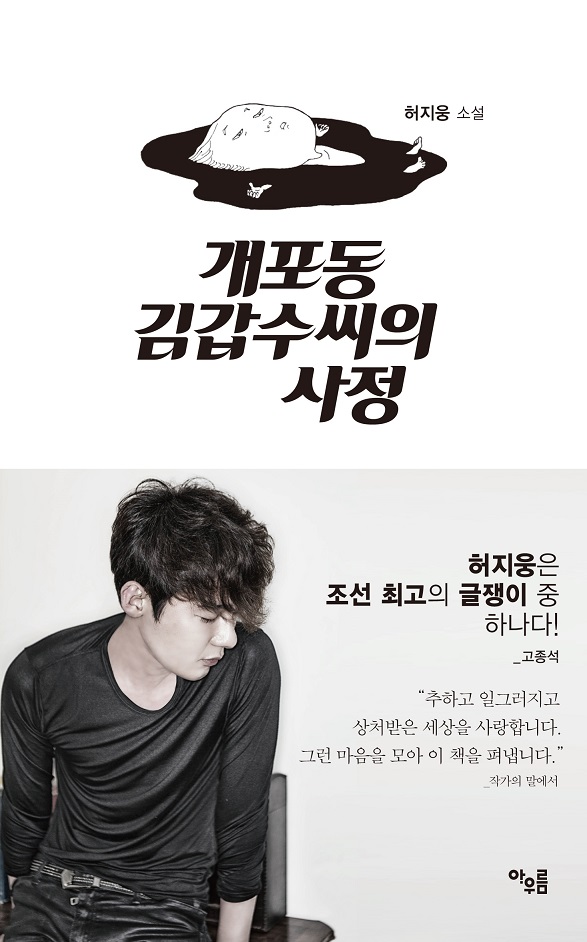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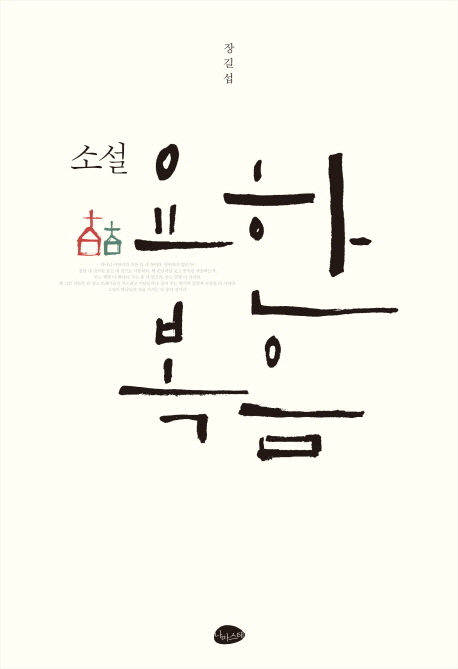



![슬퍼하는 나무 [과1]](https://image.aladin.co.kr/product/29939/32/cover200/k802838537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