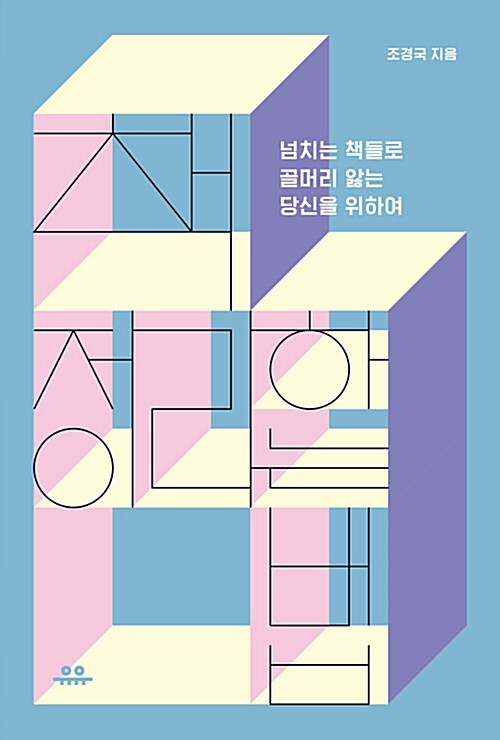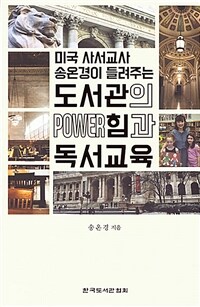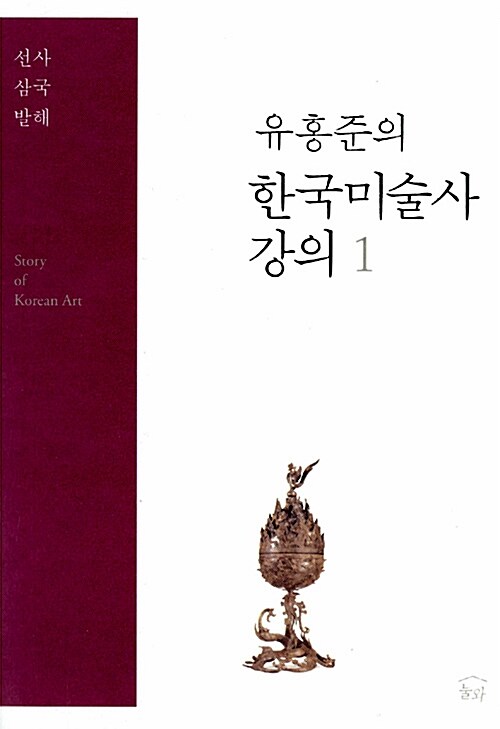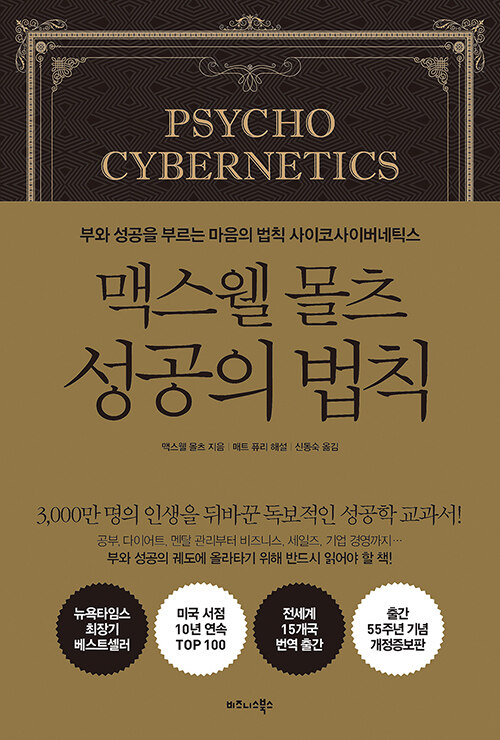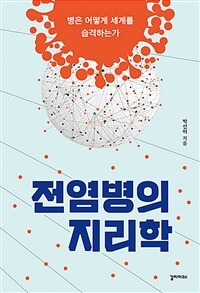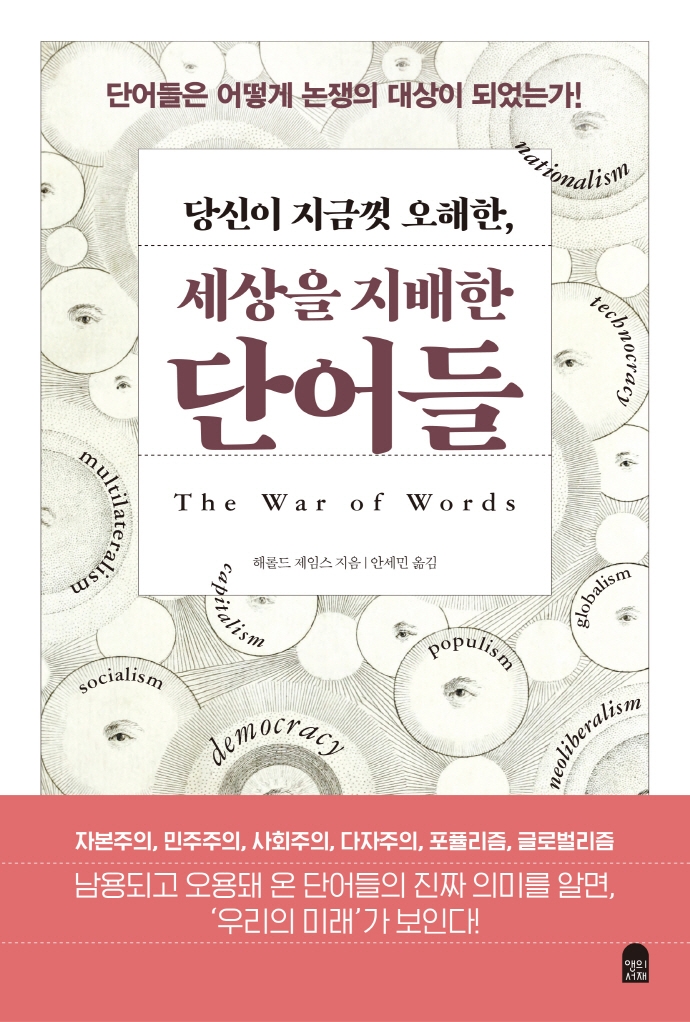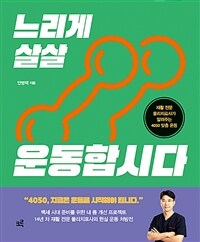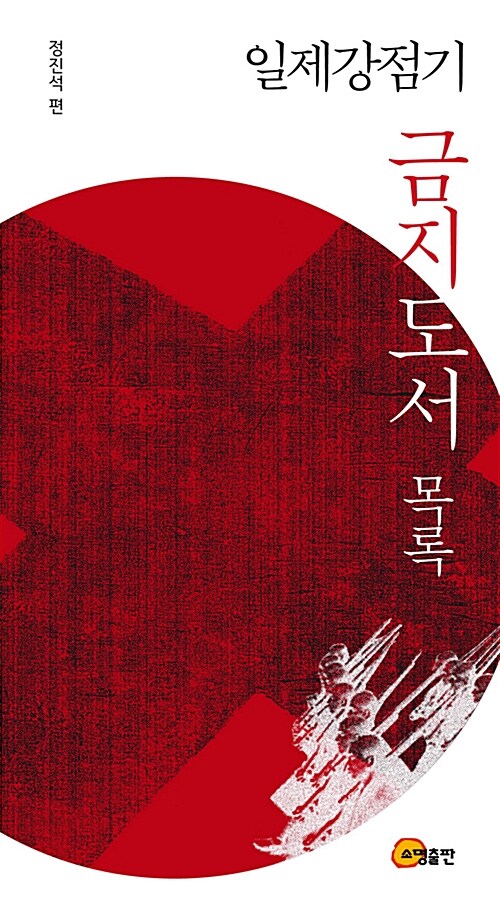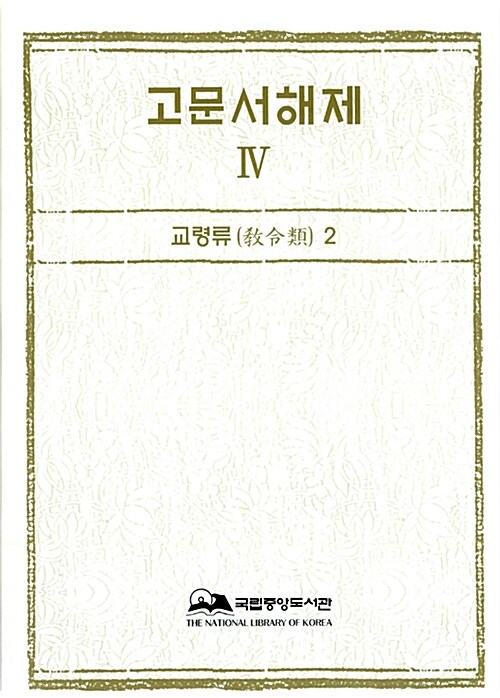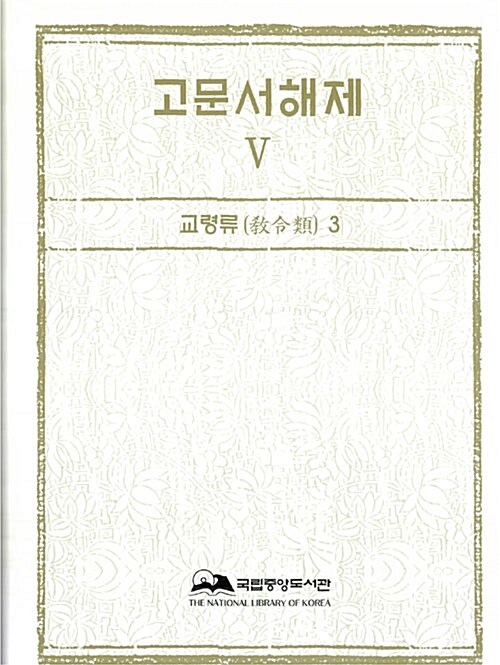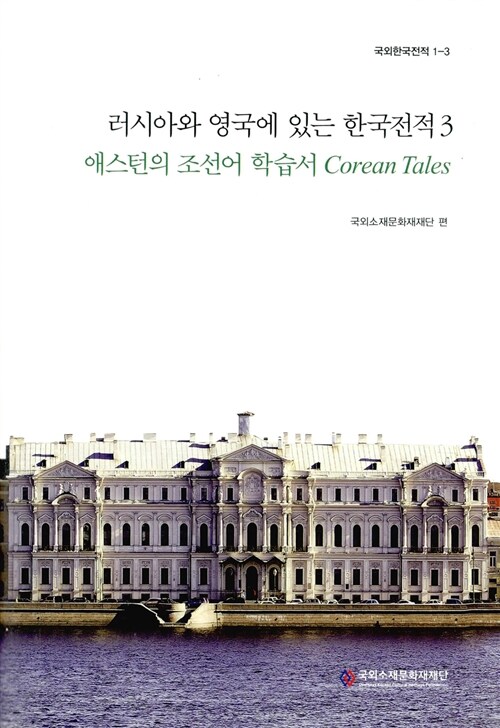인기도서
-

-
발행연도 - 2022 / 지음: 장유승 / 파이돈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일반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96826
- ISBN 9791196374860
- 형태 344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총류 > 도서학, 서지학 > 특수서지 및 목록
- 카테고리분류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에서 ‘귀중본 이야기’로‘흔한 책’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의 저자가 이번에는『아무나 볼 수 없는 책』 ‘귀중한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돌아 왔다. 귀중본 고서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책들은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러 권의 귀중본 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물 취급을 받는 귀중본도 원래는 평범한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흔했던 책도 있고, 무언가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처럼 몇 부만 만들어 나누어 가진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는가 하면, 힘들여 펴냈지만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책도 있습니다. 모든 고서는 책 한 권 분량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귀중한 책의 실물은 아무나 보기 어렵다. 볼 수 있는 건 고작해야 유리 진열장에 갇힌 모습이다. 겉모습만 구경할 뿐, 책은 한 장도 읽을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복사본이나 사진을 보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약 28만 권의 고서가 있다. 그중 963종 3,475권이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이 귀중한 책일까?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 기준의 항목은 12가지이다. 우선 시기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체로 고서 전문가들은 임진왜란 이전(1592)의 책을 귀중본으로 간주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준은 조선조 제17대 효종조 이전(1659년)의 책을 귀중본으로 본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나 1910년 이전 한국 관련 외국자료,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 등 근현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밖에 하나뿐이거나 몇 없는 책 등 수량이나 소장자에 관한 조건과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 등이 기준이다. 그러나 저자는 귀중본의 실체는 한마디로 ‘드문 책’이며 귀중본을 결정짓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책의 물리적 특징, 즉 물성이라고 말한다.
서가브라우징
같이 빌린 책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1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1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3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