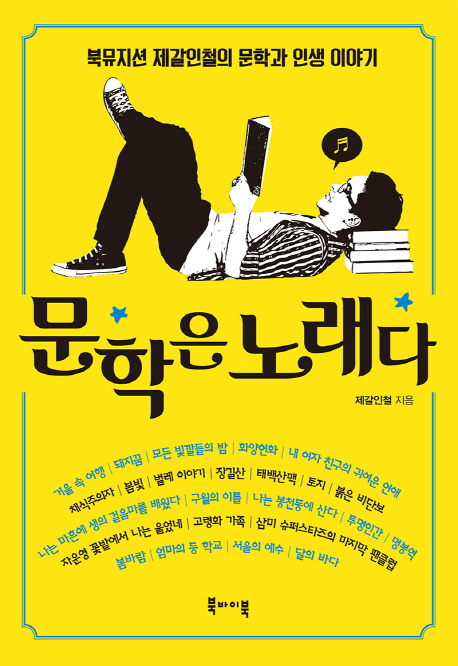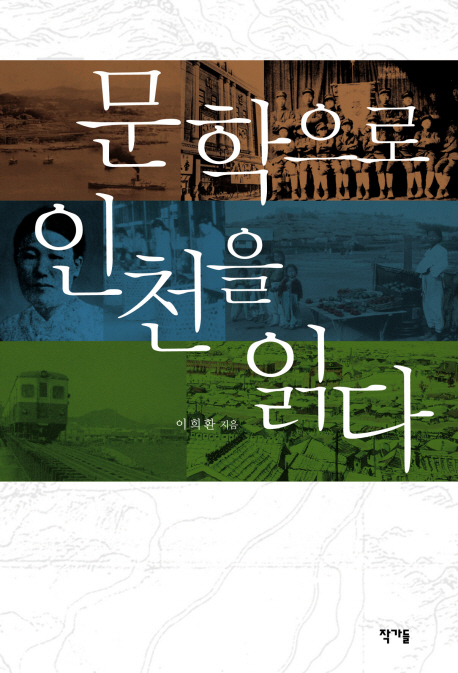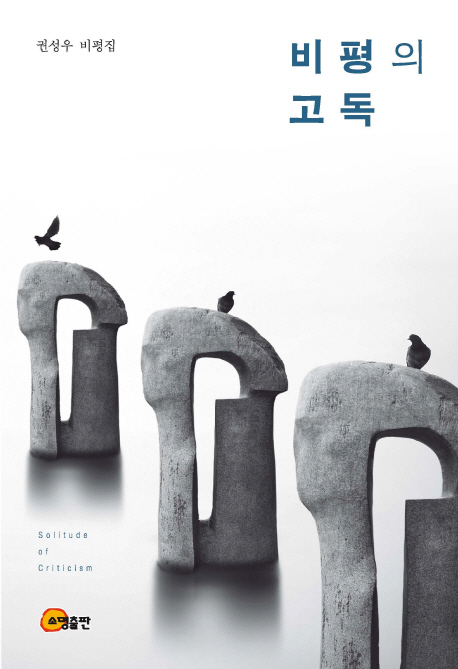인기도서
-

-
발행연도 - 2015 / 김계자 / 역락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18219
- ISBN 9791156861898
- 형태 236 p. 24 cm
- 한국십진분류 문학 > 한국문학 >
- 카테고리분류 에세이/시/희곡 > 문학의 이해 > 한국문학론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목차
제1부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문학
도한 일본인의 일상과 식민지 ‘조선’의 생성
1. 들어가는 말
2. 잡지 『조선』의 문예란
3. 인식으로서의 ‘한국(韓國)’과 ‘조선(朝鮮)’
4. 번역되는 ‘조선’
5. 맺음말
재조일본인 잡지『조선시론』과 동시대 조선문학의 번역
1.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과 재조일본인
2. 오야마 도키오와 잡지 『조선시론』
3. 『조선시론』에 번역 소개된 도이대 조선의 문학
4. 조선 문학작품의 일본어역에서 보이는 문제
5. 재조일본인이 번역한 ‘조선’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문학장
1. 들어가는 말
2. 1920년대 조선의 일본어잡지와 창작 주체
3. 『조선급만주』와 『조선공론』에 실린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
4. 식민지 조선에서 동상이몽의 ‘일선(日鮮)’
5. 맺음말
일제의 ‘북선(北鮮)’ 기행
1. 일제강점기 조선의 명칭
2. 1920~30년대 ‘분선’ 담론
3. ‘북선’ 기행과 식민지 풍경
4. 확장되는 제국의 이미지와 재조일본인의 우울
제2부 근대 일본문단과 조선인의 문학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전진(進め)』과 조선인의 문학
1.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와 식민지 조선
2.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 『전진』
3. 『전진』에 투고된 식민지 조선인의 글
4. 식민지 조선인의 이주민문학
5. 맺음말
장혁주의「춘향전」을 통해 본 제국과 식민지의 변주
1. 들어가는 말
2. ‘일본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의 공모와 균열
3. 신문학 형식의 「춘향전」
4. 장혁주 「춘향전」의 구성과 근대 리얼리즘
5. 제국과 식민지가 혼종하고 있는 장혁주의 「춘향전」
잡지『문예수도(文藝首都)』와 김사량의 문학
1. 들어가는 말
2. 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3. 잡지 『문예수도』와 편집자 야스타카 도쿠조
4.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와 잡지 『문예수도』
5.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 혹은 ‘경계’
6. 맺음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의 지식인 연대
1. 들어가는 말
2. 근대 일본의 조선문학 ‘붐’
3. 일본문단에서 연계되는 식민지의 문학
4. ‘경계’의 사유
5. 맺음말
제3부 식민지 이후의 일본어문학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
1. 들어가는 말
2. 첫 창작시집 『지평선』
3. 『지평선』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
4. 조국에 바치는 노래와 재일을 사는 의미
해방과 패전을 가로지르는 김석범의『1945년 여름』
1. 들어가는 말
2. 왜 『1945년 여름』인가
3. 해방과 패전을 가로지르는 폭력
4. <8·15>의 기억의 지연, 그리고 새로운 ‘출발’
5. 맺음말
참고문헌
도한 일본인의 일상과 식민지 ‘조선’의 생성
1. 들어가는 말
2. 잡지 『조선』의 문예란
3. 인식으로서의 ‘한국(韓國)’과 ‘조선(朝鮮)’
4. 번역되는 ‘조선’
5. 맺음말
재조일본인 잡지『조선시론』과 동시대 조선문학의 번역
1.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과 재조일본인
2. 오야마 도키오와 잡지 『조선시론』
3. 『조선시론』에 번역 소개된 도이대 조선의 문학
4. 조선 문학작품의 일본어역에서 보이는 문제
5. 재조일본인이 번역한 ‘조선’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문학장
1. 들어가는 말
2. 1920년대 조선의 일본어잡지와 창작 주체
3. 『조선급만주』와 『조선공론』에 실린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
4. 식민지 조선에서 동상이몽의 ‘일선(日鮮)’
5. 맺음말
일제의 ‘북선(北鮮)’ 기행
1. 일제강점기 조선의 명칭
2. 1920~30년대 ‘분선’ 담론
3. ‘북선’ 기행과 식민지 풍경
4. 확장되는 제국의 이미지와 재조일본인의 우울
제2부 근대 일본문단과 조선인의 문학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전진(進め)』과 조선인의 문학
1.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와 식민지 조선
2.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잡지 『전진』
3. 『전진』에 투고된 식민지 조선인의 글
4. 식민지 조선인의 이주민문학
5. 맺음말
장혁주의「춘향전」을 통해 본 제국과 식민지의 변주
1. 들어가는 말
2. ‘일본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의 공모와 균열
3. 신문학 형식의 「춘향전」
4. 장혁주 「춘향전」의 구성과 근대 리얼리즘
5. 제국과 식민지가 혼종하고 있는 장혁주의 「춘향전」
잡지『문예수도(文藝首都)』와 김사량의 문학
1. 들어가는 말
2. 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3. 잡지 『문예수도』와 편집자 야스타카 도쿠조
4.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와 잡지 『문예수도』
5.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 혹은 ‘경계’
6. 맺음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의 지식인 연대
1. 들어가는 말
2. 근대 일본의 조선문학 ‘붐’
3. 일본문단에서 연계되는 식민지의 문학
4. ‘경계’의 사유
5. 맺음말
제3부 식민지 이후의 일본어문학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
1. 들어가는 말
2. 첫 창작시집 『지평선』
3. 『지평선』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
4. 조국에 바치는 노래와 재일을 사는 의미
해방과 패전을 가로지르는 김석범의『1945년 여름』
1. 들어가는 말
2. 왜 『1945년 여름』인가
3. 해방과 패전을 가로지르는 폭력
4. <8·15>의 기억의 지연, 그리고 새로운 ‘출발’
5. 맺음말
참고문헌
서가브라우징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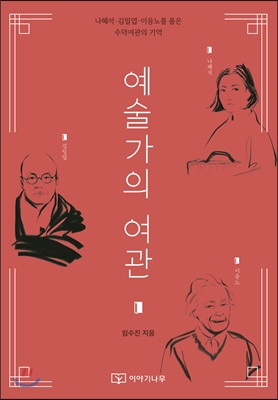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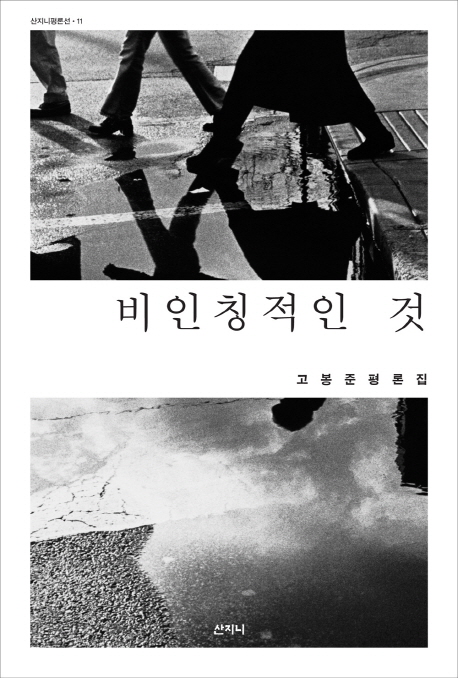




![(큰글)현대수필. 16, 노천명3 : [큰글자도서]](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83/852/08385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