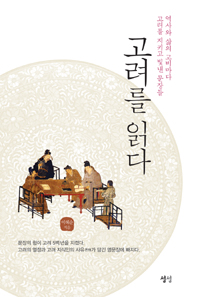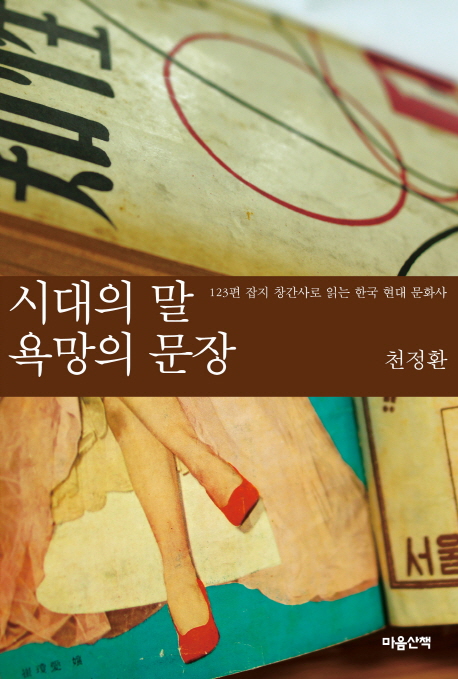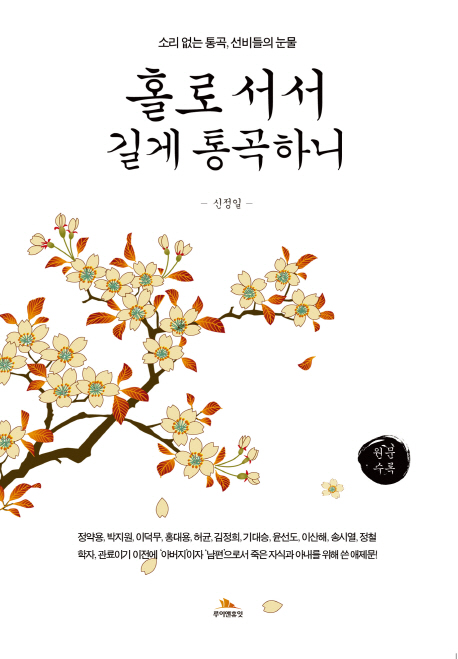신착도서
-

-
백성은 물, 임금은 배 : 300년 전, 백성 편에 선 목민관의 목소리
발행연도 - 2012 / 이정옥 엮음 / 글누림출판사-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95042
- ISBN 9788963272207
- 형태 411 p. 23 cm
- 한국십진분류 문학 > 한국문학 >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한국사 > 조선시대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조선 후기의 문신 병와 이형상, 이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병와 이형상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당화에 휩쓸린 조선조 후기 관료사회의 모순들을 혁신하려고 노력한 학자임과 동시에, 청렴한 ‘정치인’이었다.
목차
글 머리에
1부 백성이 궁하면 어찌 인심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글 백성은 물, 임금은 배
백성은 물, 임금은 배
항간의 말과 노래를 채집하여 책을 엮다
이인좌의 난을 토평하려다 무고의 혐의를
제주도의 실정과 풍속을 그림으로 남기다
백성이 궁하면 어찌 인심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유랑 무리들도 하늘이 낸 이 나라 백성인데
두 번째 글 전정(田政)은 공평 균등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는 줄더라도 백성의 생활은 충족하게 하는 정치를
이 세상에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유적이
풍습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해괴하여 통탄할 일
비로소 한라산을 명산으로 승격하여 제를 지내다
아래를 거느림에는 반드시 관용에 이를 것이다
세 번째 글 왜(倭)에게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대의에도 벗어나며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이 먼저요
관방의 시설에 대해 마땅히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국력이 견밀하면 수모를 당하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저 교활한 왜(倭)가
네 번째 글 노비 해방의 선구자, 그리고 가족사랑
약 천여 구(口)의 노비가 재물이 아니다
집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도
흩어진 것은 기운이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정신이니
마땅히 닦을 것은 오직 검소함뿐이다
게으른 습관으로는 선비가 못된다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다섯 번째 글 예악(禮樂)의 처음과 끝
예(禮)는 하늘의 도리, 악(樂)은 인성의 여운
우리나라에도 아악(雅樂)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이 이미 잇소리에 치우쳐
명곡 최석정의 담론 : 성음과 악학을 완성하다
심지어는 공당(公堂)에서 노래 부르며 술병을 두드리는 자까지 있으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 문자로 기록하지 못할 것 없으니
여섯 번째 글 병와의 여행기
한라산을 오르다
입암유산록(立巖遊山錄)
2부 새롭게 주목할 인물, 병와 이형상
첫 번째 글 조선시대 목민관 병와 이형상
호를 병와(甁窩)로 삼은 이유
박상기(薄相記)
단금명(檀琴銘)
오성찬(五聖贊), 공재 윤두서의 <오성도>
숙종 임금의 유서(諭書)
병와의 인장과 낙관(落款)
혼돈각명(混沌殼銘)
두 번째 글 조선 최대의 저술을 남긴 병와 이형상
병와 이형상의 저술
나는 부자에게는 더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
포부가 크면 세속과는 부합되지 못하고
참고문헌
미주
1부 백성이 궁하면 어찌 인심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글 백성은 물, 임금은 배
백성은 물, 임금은 배
항간의 말과 노래를 채집하여 책을 엮다
이인좌의 난을 토평하려다 무고의 혐의를
제주도의 실정과 풍속을 그림으로 남기다
백성이 궁하면 어찌 인심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유랑 무리들도 하늘이 낸 이 나라 백성인데
두 번째 글 전정(田政)은 공평 균등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는 줄더라도 백성의 생활은 충족하게 하는 정치를
이 세상에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유적이
풍습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해괴하여 통탄할 일
비로소 한라산을 명산으로 승격하여 제를 지내다
아래를 거느림에는 반드시 관용에 이를 것이다
세 번째 글 왜(倭)에게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대의에도 벗어나며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이 먼저요
관방의 시설에 대해 마땅히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국력이 견밀하면 수모를 당하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저 교활한 왜(倭)가
네 번째 글 노비 해방의 선구자, 그리고 가족사랑
약 천여 구(口)의 노비가 재물이 아니다
집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도
흩어진 것은 기운이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정신이니
마땅히 닦을 것은 오직 검소함뿐이다
게으른 습관으로는 선비가 못된다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다섯 번째 글 예악(禮樂)의 처음과 끝
예(禮)는 하늘의 도리, 악(樂)은 인성의 여운
우리나라에도 아악(雅樂)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이 이미 잇소리에 치우쳐
명곡 최석정의 담론 : 성음과 악학을 완성하다
심지어는 공당(公堂)에서 노래 부르며 술병을 두드리는 자까지 있으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 문자로 기록하지 못할 것 없으니
여섯 번째 글 병와의 여행기
한라산을 오르다
입암유산록(立巖遊山錄)
2부 새롭게 주목할 인물, 병와 이형상
첫 번째 글 조선시대 목민관 병와 이형상
호를 병와(甁窩)로 삼은 이유
박상기(薄相記)
단금명(檀琴銘)
오성찬(五聖贊), 공재 윤두서의 <오성도>
숙종 임금의 유서(諭書)
병와의 인장과 낙관(落款)
혼돈각명(混沌殼銘)
두 번째 글 조선 최대의 저술을 남긴 병와 이형상
병와 이형상의 저술
나는 부자에게는 더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
포부가 크면 세속과는 부합되지 못하고
참고문헌
미주
서가브라우징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