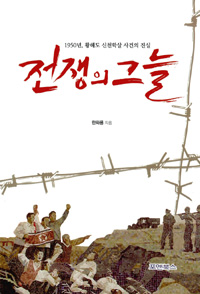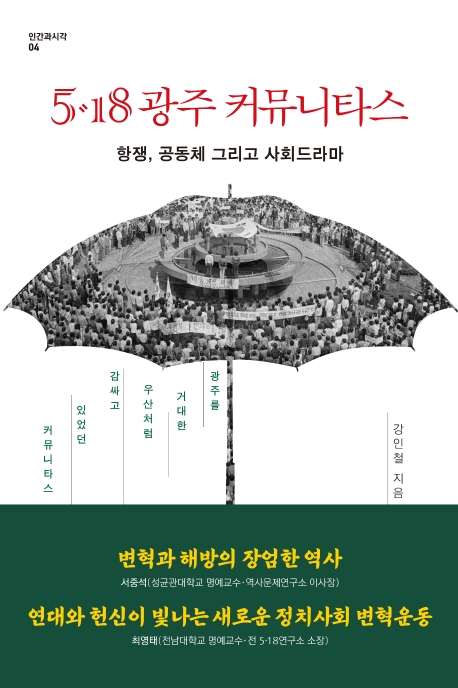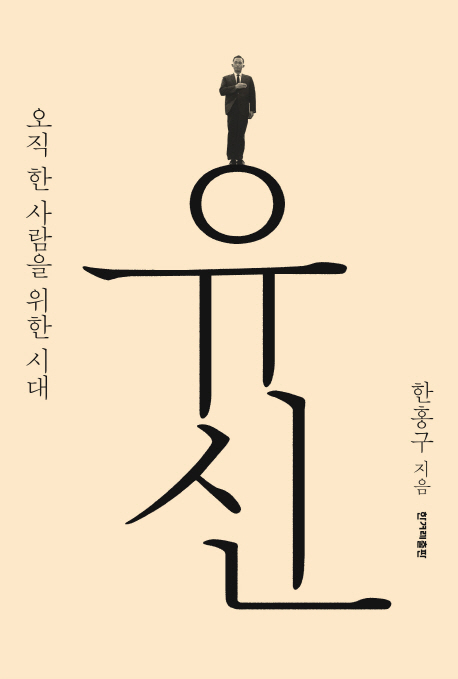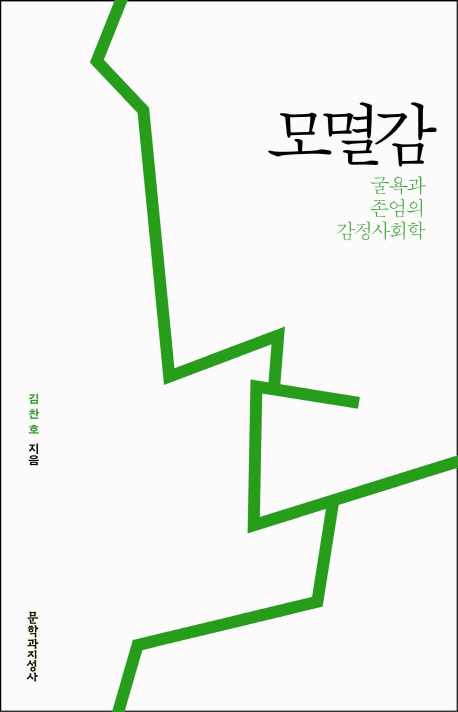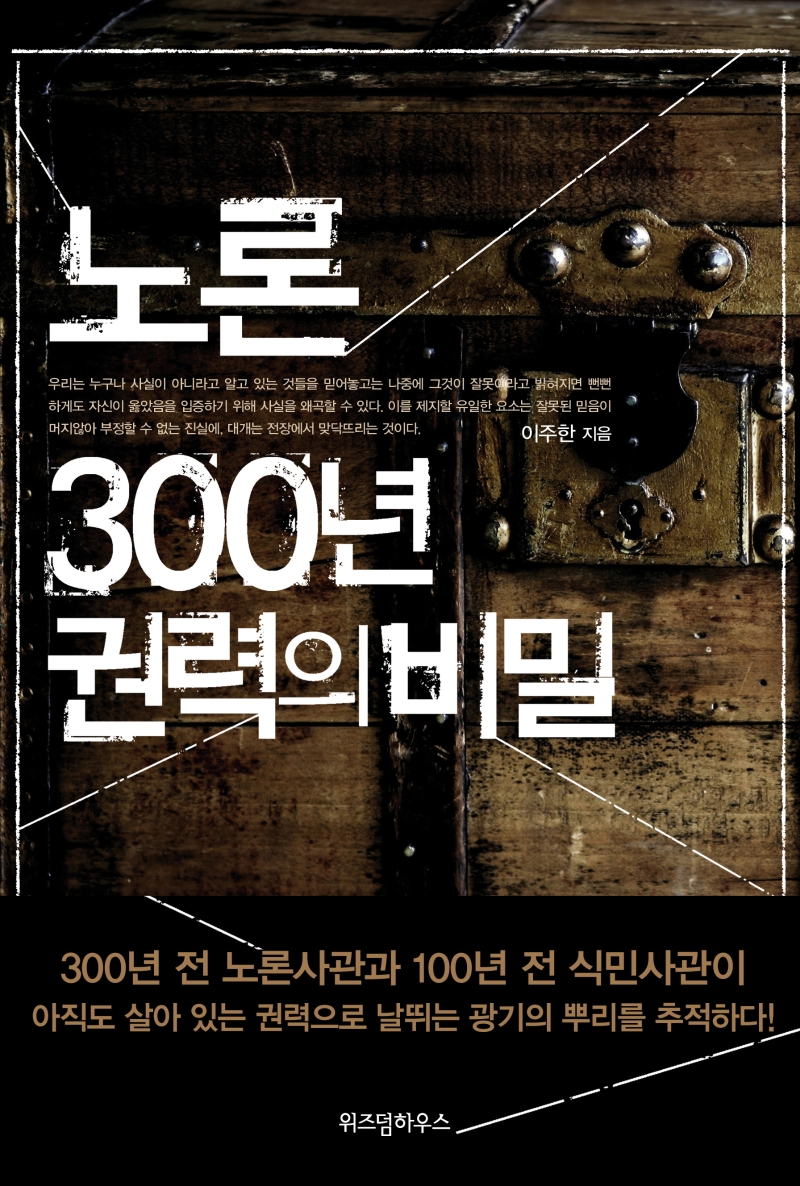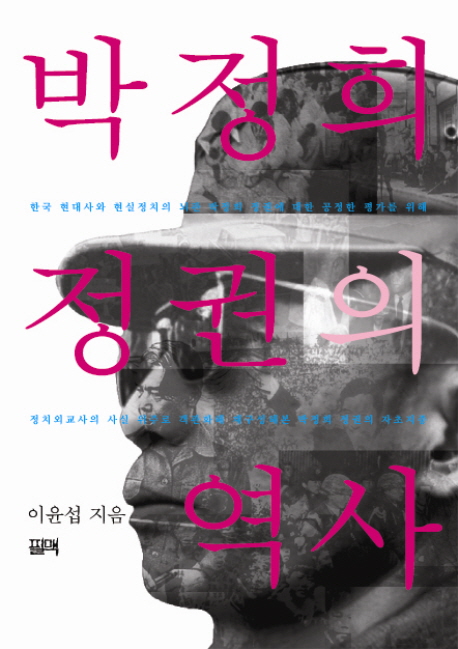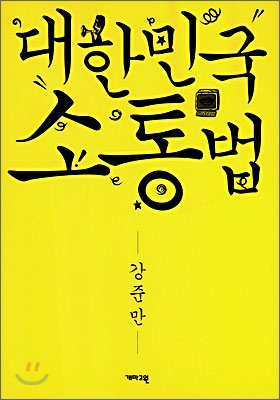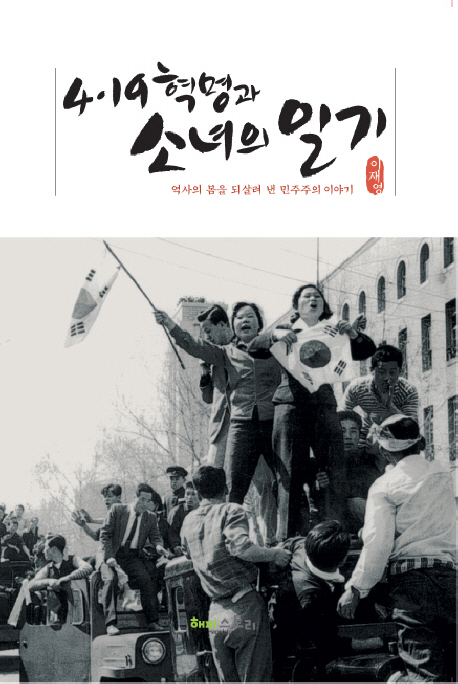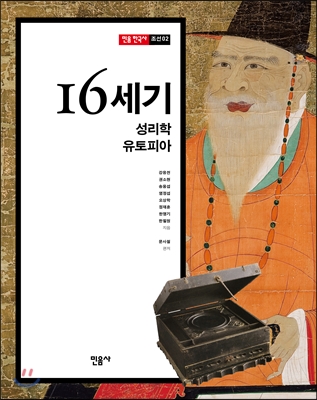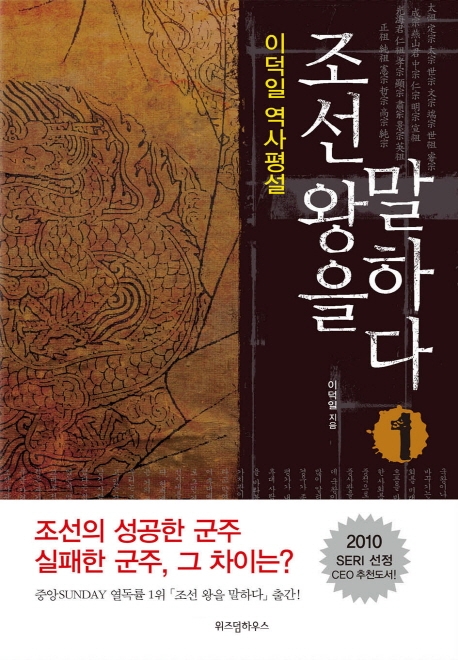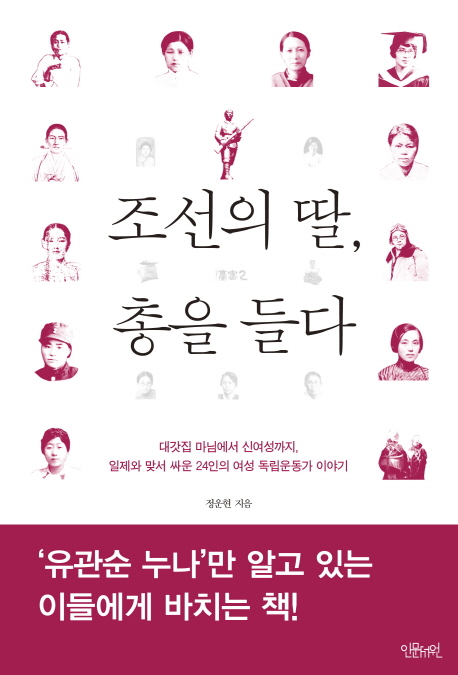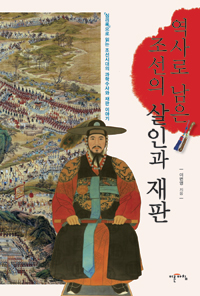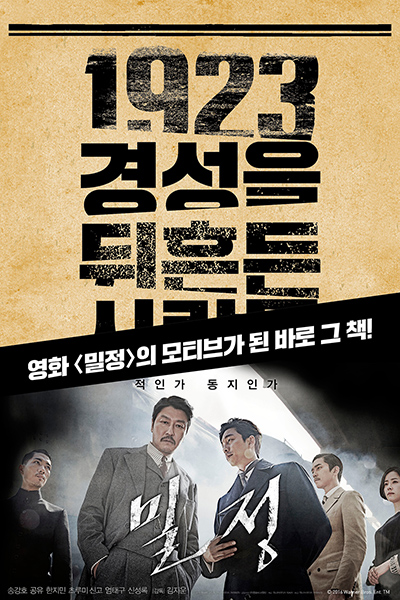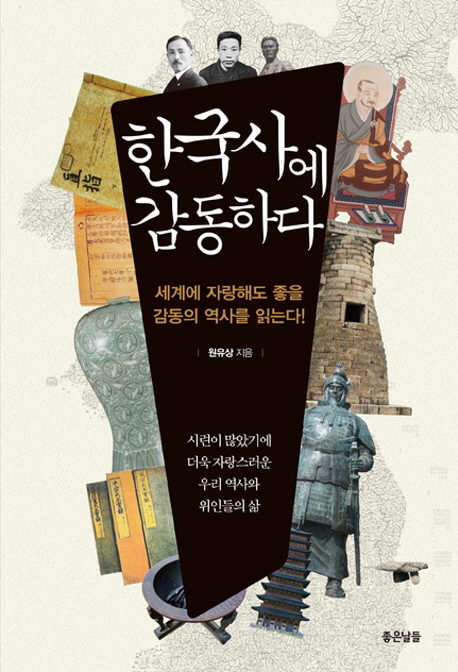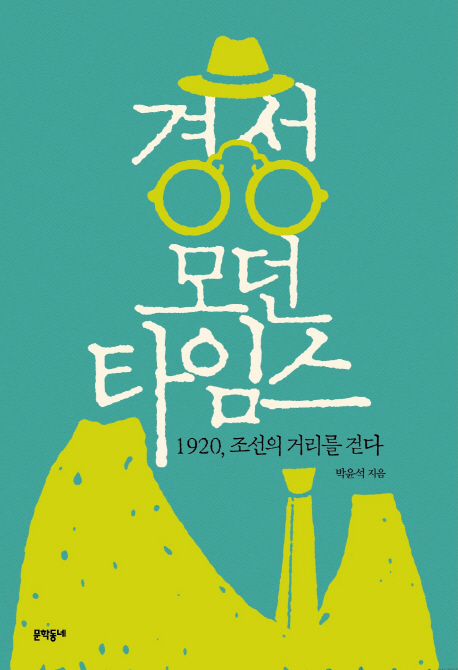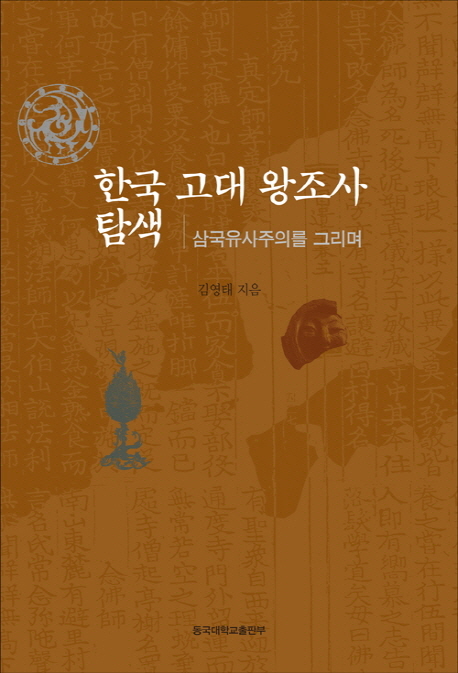인기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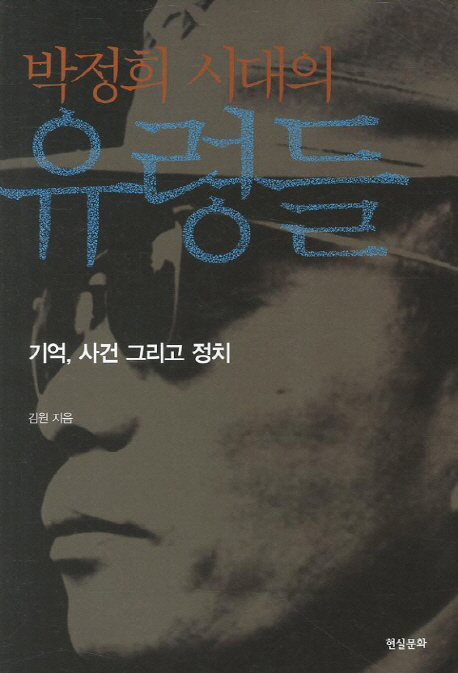
-
발행연도 - 2011 / 지음: 김원 / 현실문화연구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일반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80185
- ISBN 9788965640196
- 형태 623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역사 > 아시아 > 한국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한국사 > 한국근현대사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여공 1970-그녀들의 반역사> 이후 5년만의 방황과 침묵을 깨고 출간한 김원의 역작.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는 바로 1960~70년대의 서발턴들을 불러내 그들의 삶을 재현한 작업이자 그 이론적인 고민까지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이 서발턴들을 ‘유령’이라는 은유를 통해 호명한다.
목차
발문
유령과의 동거를 위하여 /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더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로 번창하라 / 천정환[성균관대학교 교수]
감사의 말
프롤로그 유령을 찾아가는 길
서발턴을 만나러 가는 길
타자와 경계에 선다는 것의 의미
‘민중’이란 용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사건, 그들과 만나는 ‘길 가운데 하나’
다른 소년들을 만나다
범죄자와 시민군
책의 구성에 대하여
제1부 박정희 시대와 서발턴들
1. 박정희 시대의 역사서사
만들어진 역사: 뉴라이트의 역사관
대중독재론과 도시하층민의 ‘정치’
2. 왜 서발턴인가?
서발턴, 민중사 그리고 근대 역사학
냉전과 서발턴
오염에 대한 공포
3. 박정희 시대 서발턴의 역사들
산업전사의 이름으로: 베트남 파병 병사와 파독 노동자의 기억
우리는 애국자인가?: 냉전과 기지촌 여성
도시하층민, 더러운 것들
살부지의(殺父之意)
제2부 타자의 기억
1. 두 이주여성 이야기: 파독 간호사의 이주노동에 대한 기억
두 여성과 만나다
1960~70년대 여성과 이주노동
간호유학에서 파독 간호사로
누가 독일로 갔나
딸이라는 이름
결심, 독일로 가다
파독 간호사가 되다
오염된 여성들: 한국에서의 담론
노란 천사
공포와 회색인
타자의 다른 기억: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2. 죽음의 기억, 망각의 검은 땅: 광부들의 과거와 현재
탄광은 암울했다: 김성탁의 기억
탄광, 참말로 허무했어; 차효래의 기억
부탁드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윤덕호와 이영희의 기억
기억공동체: 망각의 트라우마
3. 박현채, 소년 빨치산과 노예의 언어
민족경제론의 형성: 4.19 경험과 1960년대
마음속의 자기검열
‘간첩-지식인’ 이란 오명(stigma)
마음의 검열관: 빨갱이의 침묵
계급조화: 개념의 우회
차마 하지 못한 말: 도시게릴라전
대중경제론: 노예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
박현채와 빨치산 경험
좌익 친척들과 해방 맞이
프롤레타리아트를 꿈꾸던 학내 지도자
소년, 빨치산이 되다
소년 문화중대장
두 은인(恩人)
삶과 죽음 사이에서: 빨치산의 일상
어려운 시절: 밀리는 전선, 증가하는 이탈자
제3부 서발턴과 사건
1. 황량한 ‘광주’에서 정치를 상상하다: 광주대단지 사건
박정희 시대의 ‘구빈원’
대단지의 하층민들과 민심의 이탈
민중선동과 봉기: 전성천과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와 다른 정치의 가능성
2. 훼손된 영웅과 폭력의 증언: 무등산 타잔 사건
철거촌의 거억, 1989~1990 그리고 1977
박흥숙의 생애사: 1954~1980
도시는 만원이다
공간적 배제와 타락한 성벽
임시조치법과 도시빈민의 공간적 배제
무속에 대한 의구심; 1970년대 신흥종교의 사회문제화
새마을운동: 미신타파
폭도, 타잔 그리고 이소룡
불화와 정착
훼손된 영웅과 폭력의 증언
3. 소년원을 탈출한 아이들: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
‘소년원 탈출 사건’을 둘러싼 지형도: 1945~1979년
보호 대상으로서 소년-보호와 수용시설로서 소년원: 1945~1950년대
소년범죄의 탄생: 1961년
비정상인에 대한 지식체계 등장: 1970년대
자격 박탈이란 문턱 앞에서
4.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원한과 분노의 장소들, 부산 그리고 마산
봉기의 불은 밤에 타오르다
도시하층민의 타자화
도시하층민의 ‘정치’
제4부 정치
1. 한국 사회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는가?
기억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이야기, 실마리 그리고 상상력
기억과 사회적인 것
대항기억과 익명적 지식
재현될 수 없는 타자의 가능성
공감. 고통의 연대 그리고 임상역사가
당신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가
서발턴의 역사는 쓰일 수 있나
2. 사건으로서 정치와 차이의 공간
사건, 잉여의 출현
사건으로서 정치
차이의 공간과 정치
에필로그 박정희 시대, 서발턴 그리고 유령들의 역사
부록
1. 1960~70년대 박현채 저작 연보
2. 민민청과 통민청: 봉건성, 매판성, 대외의존성
3. 남민전: 반외세 민족통일
4. 박흥숙과 호남
5. 구술, 기억 그리고 민중사
6. 화이트 노동자
주석
참고문헌
유령과의 동거를 위하여 /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더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로 번창하라 / 천정환[성균관대학교 교수]
감사의 말
프롤로그 유령을 찾아가는 길
서발턴을 만나러 가는 길
타자와 경계에 선다는 것의 의미
‘민중’이란 용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사건, 그들과 만나는 ‘길 가운데 하나’
다른 소년들을 만나다
범죄자와 시민군
책의 구성에 대하여
제1부 박정희 시대와 서발턴들
1. 박정희 시대의 역사서사
만들어진 역사: 뉴라이트의 역사관
대중독재론과 도시하층민의 ‘정치’
2. 왜 서발턴인가?
서발턴, 민중사 그리고 근대 역사학
냉전과 서발턴
오염에 대한 공포
3. 박정희 시대 서발턴의 역사들
산업전사의 이름으로: 베트남 파병 병사와 파독 노동자의 기억
우리는 애국자인가?: 냉전과 기지촌 여성
도시하층민, 더러운 것들
살부지의(殺父之意)
제2부 타자의 기억
1. 두 이주여성 이야기: 파독 간호사의 이주노동에 대한 기억
두 여성과 만나다
1960~70년대 여성과 이주노동
간호유학에서 파독 간호사로
누가 독일로 갔나
딸이라는 이름
결심, 독일로 가다
파독 간호사가 되다
오염된 여성들: 한국에서의 담론
노란 천사
공포와 회색인
타자의 다른 기억: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2. 죽음의 기억, 망각의 검은 땅: 광부들의 과거와 현재
탄광은 암울했다: 김성탁의 기억
탄광, 참말로 허무했어; 차효래의 기억
부탁드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윤덕호와 이영희의 기억
기억공동체: 망각의 트라우마
3. 박현채, 소년 빨치산과 노예의 언어
민족경제론의 형성: 4.19 경험과 1960년대
마음속의 자기검열
‘간첩-지식인’ 이란 오명(stigma)
마음의 검열관: 빨갱이의 침묵
계급조화: 개념의 우회
차마 하지 못한 말: 도시게릴라전
대중경제론: 노예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
박현채와 빨치산 경험
좌익 친척들과 해방 맞이
프롤레타리아트를 꿈꾸던 학내 지도자
소년, 빨치산이 되다
소년 문화중대장
두 은인(恩人)
삶과 죽음 사이에서: 빨치산의 일상
어려운 시절: 밀리는 전선, 증가하는 이탈자
제3부 서발턴과 사건
1. 황량한 ‘광주’에서 정치를 상상하다: 광주대단지 사건
박정희 시대의 ‘구빈원’
대단지의 하층민들과 민심의 이탈
민중선동과 봉기: 전성천과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와 다른 정치의 가능성
2. 훼손된 영웅과 폭력의 증언: 무등산 타잔 사건
철거촌의 거억, 1989~1990 그리고 1977
박흥숙의 생애사: 1954~1980
도시는 만원이다
공간적 배제와 타락한 성벽
임시조치법과 도시빈민의 공간적 배제
무속에 대한 의구심; 1970년대 신흥종교의 사회문제화
새마을운동: 미신타파
폭도, 타잔 그리고 이소룡
불화와 정착
훼손된 영웅과 폭력의 증언
3. 소년원을 탈출한 아이들: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
‘소년원 탈출 사건’을 둘러싼 지형도: 1945~1979년
보호 대상으로서 소년-보호와 수용시설로서 소년원: 1945~1950년대
소년범죄의 탄생: 1961년
비정상인에 대한 지식체계 등장: 1970년대
자격 박탈이란 문턱 앞에서
4. 1979년 가을, 부마를 뒤덮은 유령들
원한과 분노의 장소들, 부산 그리고 마산
봉기의 불은 밤에 타오르다
도시하층민의 타자화
도시하층민의 ‘정치’
제4부 정치
1. 한국 사회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는가?
기억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이야기, 실마리 그리고 상상력
기억과 사회적인 것
대항기억과 익명적 지식
재현될 수 없는 타자의 가능성
공감. 고통의 연대 그리고 임상역사가
당신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가
서발턴의 역사는 쓰일 수 있나
2. 사건으로서 정치와 차이의 공간
사건, 잉여의 출현
사건으로서 정치
차이의 공간과 정치
에필로그 박정희 시대, 서발턴 그리고 유령들의 역사
부록
1. 1960~70년대 박현채 저작 연보
2. 민민청과 통민청: 봉건성, 매판성, 대외의존성
3. 남민전: 반외세 민족통일
4. 박흥숙과 호남
5. 구술, 기억 그리고 민중사
6. 화이트 노동자
주석
참고문헌
서가브라우징
같이 빌린 책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1 |
| 60대 | 0 |
| 70대 | 1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1 |
| 2023년 | 0 |
| 2024년 | 1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