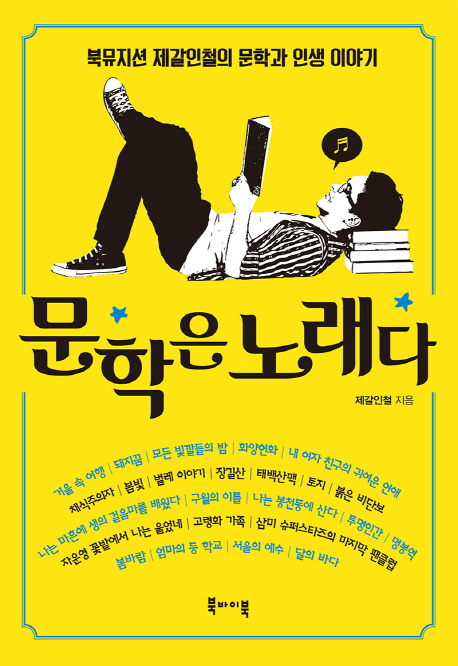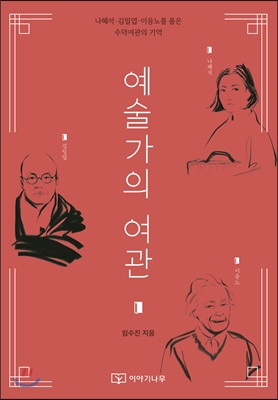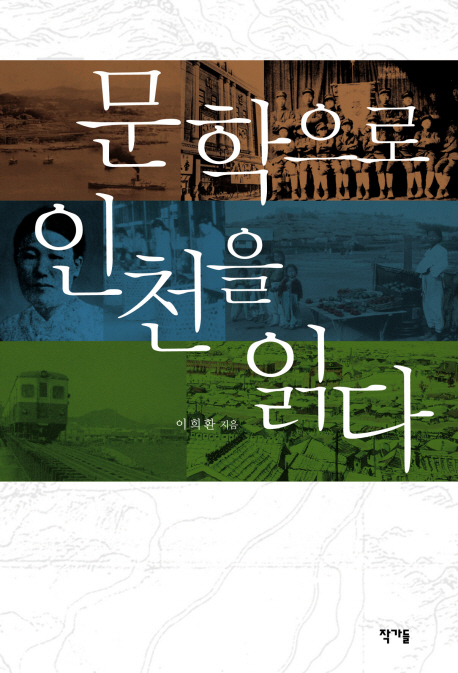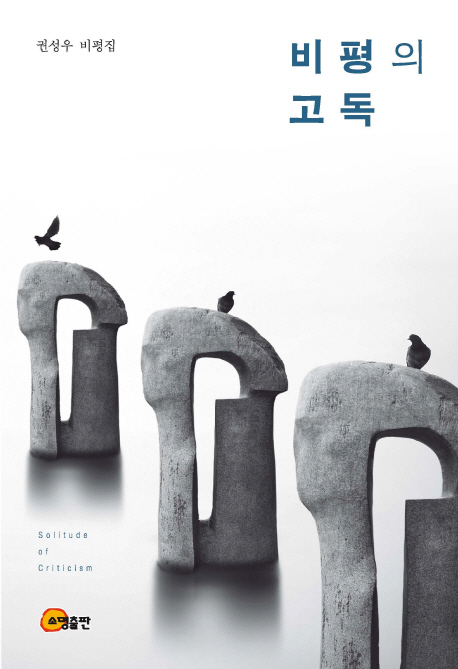추천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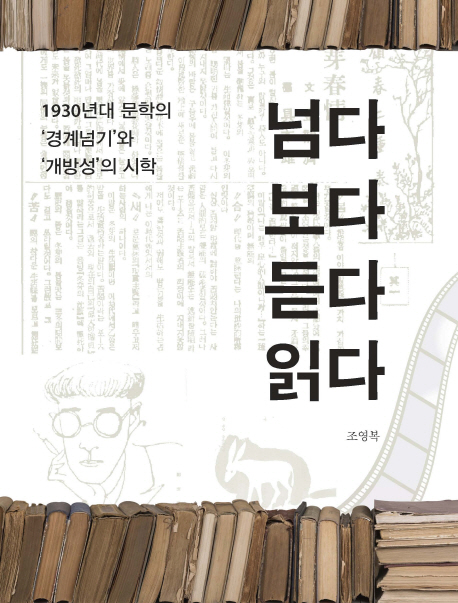
-
넘다 보다 듣다 읽다 = Cross, watch, listen and read : 1930년대 문학의 '경계넘기'와 '개방성'의 시학
발행연도 - 2013 / 지은이: 조영복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30698
- ISBN 9788952114280
- 형태 xi, 576 p. 23 cm
- 한국십진분류 문학 > 한국문학 >
- 카테고리분류 에세이/시/희곡 > 시 > 한국시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문학성을 기준으로 문학 내부적 관점을 떠나 문학 외부와의 '경계넘기'라는 시각을 도입한 책이다. 이를 혼종성의 미학, 곧 개방성과 융합의 관점에서 1930년대 문학사를 고찰했다.
목차
책을 내면서
Ⅰ. 1930년대 문학의 구도
1930년대 문학을 보는 시각
혼종성(hybridity), 개방성(openness), ‘경계넘기(borders-crossing)’의 개념과 미학
1930년대 시네마틱 모더니즘(Cinematic Modernism)과 ‘윤전기’ 미학
신문·잡지 저널리즘의 계보학 및 학예면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신흥예술파적, 입체주의 미학
‘문인-화가’ 공동체와 물질적·감각주의 미학의 탐구자들
영화, 활판 인쇄술의 뉴미디어 감각과 혼종 에크리튀르, 혼종 장르의 탄생
Ⅱ. 뉴미디어와 텍스트성의 변화
구술의 공간과 살아 있는 언어
‘활자’의 큐비즘(cubism)적 환각과 말과 글의 혼종적 오케스트라화
이미지즘의 지평: 문자·회화·영화의 매체적 상호 혼종과 교향악적 공명을 향한 언어의 유토피아
라디오, 전화, 영화, 축음기의 매체적·문화적 혼종성과 문자 언어의 구술적 효과
카프의 매체운동의 계보와 시네 포에틱스의 대중화 전략
새로운 에크리튀르의 탄생과 시화, 화문, 에스프리 장르의 축제
장정의 캘리그라피적 감각과 입체주의
Ⅲ. ‘경계넘기’의 상상력 혹은 오마주(hommage)
현해탄을 넘어, 파리(Paris) 혹은 ‘문학’이라는 근원성
장 콕토의 멀티미디어적 상상력과 단문의 시학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의 ‘기계춤’의 시적 변용과 ‘윤전기 감각’의 물질성
이상을 발견하기
예술가 공동체의 ‘라보엠적 이상’과 ‘제비’의 꿈
르네 클레르의 환상, 고발, 추적 모티프와 감각 혼종
이상은 어떻게 매체의 ‘경계를 넘어’ ‘혼종 텍스트’를 실현하고 있는가?
Ⅳ. ‘경계’를 넘어서 만나다: 한국문학의 미래적 지평
‘문학성’을 떠나, 문학을 ‘넘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Ⅰ. 1930년대 문학의 구도
1930년대 문학을 보는 시각
혼종성(hybridity), 개방성(openness), ‘경계넘기(borders-crossing)’의 개념과 미학
1930년대 시네마틱 모더니즘(Cinematic Modernism)과 ‘윤전기’ 미학
신문·잡지 저널리즘의 계보학 및 학예면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신흥예술파적, 입체주의 미학
‘문인-화가’ 공동체와 물질적·감각주의 미학의 탐구자들
영화, 활판 인쇄술의 뉴미디어 감각과 혼종 에크리튀르, 혼종 장르의 탄생
Ⅱ. 뉴미디어와 텍스트성의 변화
구술의 공간과 살아 있는 언어
‘활자’의 큐비즘(cubism)적 환각과 말과 글의 혼종적 오케스트라화
이미지즘의 지평: 문자·회화·영화의 매체적 상호 혼종과 교향악적 공명을 향한 언어의 유토피아
라디오, 전화, 영화, 축음기의 매체적·문화적 혼종성과 문자 언어의 구술적 효과
카프의 매체운동의 계보와 시네 포에틱스의 대중화 전략
새로운 에크리튀르의 탄생과 시화, 화문, 에스프리 장르의 축제
장정의 캘리그라피적 감각과 입체주의
Ⅲ. ‘경계넘기’의 상상력 혹은 오마주(hommage)
현해탄을 넘어, 파리(Paris) 혹은 ‘문학’이라는 근원성
장 콕토의 멀티미디어적 상상력과 단문의 시학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의 ‘기계춤’의 시적 변용과 ‘윤전기 감각’의 물질성
이상을 발견하기
예술가 공동체의 ‘라보엠적 이상’과 ‘제비’의 꿈
르네 클레르의 환상, 고발, 추적 모티프와 감각 혼종
이상은 어떻게 매체의 ‘경계를 넘어’ ‘혼종 텍스트’를 실현하고 있는가?
Ⅳ. ‘경계’를 넘어서 만나다: 한국문학의 미래적 지평
‘문학성’을 떠나, 문학을 ‘넘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서가브라우징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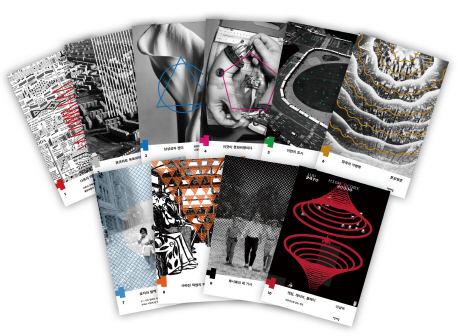










![(큰글)현대수필. 16, 노천명3 : [큰글자도서]](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83/852/08385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