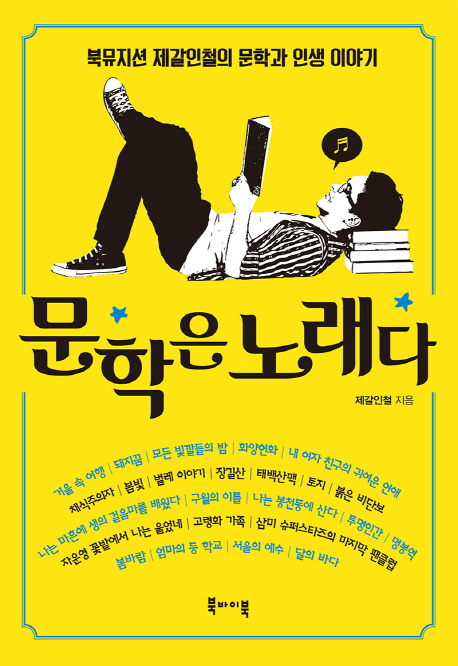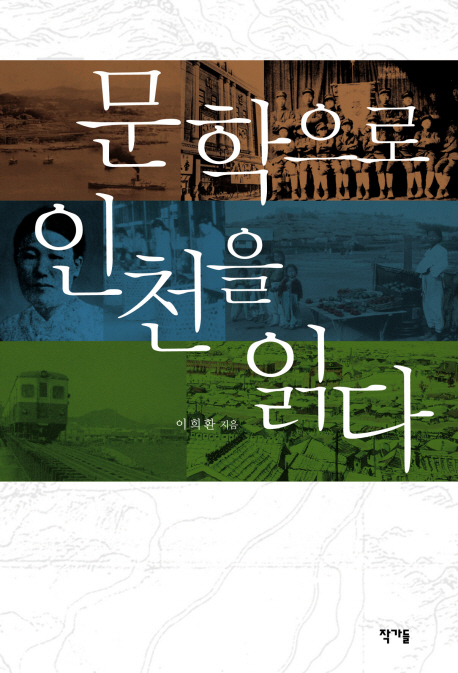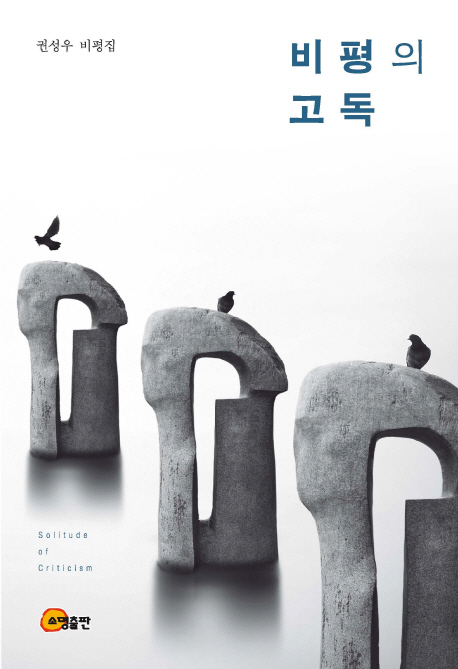신착도서
-

-
불온의 시대 : 1960년대 한국의 문학과 정치 = The age of 'buron(不穩)' : Korean literature and politics in the 1960s
발행연도 - 2017 / 지은이: 임유경 / 소명출판-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97307
- ISBN 9791159051333
- 형태 527 p. 24 cm
- 한국십진분류 문학 > 한국문학 >
- 카테고리분류 에세이/시/희곡 > 문학의 이해 > 한국문학론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불온'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1960년대 한국사회를 살핀 책. 이 책은 불온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써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불온이 과연 하나의 해석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1960년대, 두 죽음의 사이
1. 문학과 역사를 읽는 하나의 방법
2. 불온의 역사-전근대, 식민화, 분단
3. 불온의 시대-데모와 민주주의
4. 논의 대상과 쟁점들
제2장 불온청년, 신원의 정치와 성명전
1. 공안사건 전성시대, ‘북한’이라는 배후
1) 공안의 권력과 불온의 통치술
2) 사상최대의 공안사건과 불온잡지
3) ‘불문율’ 혹은 ‘감각의 양식’-반정부‧반미‧용공‧비도덕
2. 데모의 시대, 혁명과 불온
1) 청년지식인의 신원-“애국자”와 “반국가사범”
2) 주권과 혁명, 그리고 성명전
3) ‘민주주의의 적들’과 ‘지성의 비상사태’
3. 통치의 기술, 법과 서사
1) ‘법의 이름으로’, 파국의 예방과 계엄령
2) 가부장적 체제와 해제하는 권력
3) 권력의 노이로제와 학원의 정상화
4. 옥중기와 진술의 정치학
1) 참회와 갱생, 고백이라는 장치
2) ‘나를 보라’, 남겨진 시간과 글쓰기
3) ‘미해결의 장’, 분열의 기록과 교합되는 언어들
4) 징후적 텍스트와 자기 기술의 테크놀로지-자백, 전향, 옥중기
제3장 빈민대중, 비/가시성과 성원권
1. 법정에 선 문학
1) 필화사건과 검열의 논리-“작품의 명랑화”
2) 비평의 장소들과 재현의 심급-남정현 「분지」 사건
3) 불온시와 정신병-김지하 「오적」 사건
4) 문학과 법
2. 불온의 비가시역
1) ‘빈민대중’이라는 쟁점-반미, 용공, 내셔널리즘
2) 치외법권의 장소들과 불상사
3) 오염과 게토화-‘우리이면서 우리가 아닌’
3. 재현의 문화정치와 가시권의 재구축
1) 비가시성의 가시화-“들어라 코리안들아”
2) 혈육과 구경꾼, 연민의 중지
3) 현실과 픽션, 허물어지는 경계들
4. 사회적 성원권과 파괴적 자기현시, 분서(焚書)와 분신(焚身)
1) 복지국가를 떠도는 ‘무서운 풍자’
2) 불가해한 타자들, 폭동의 시간과 ‘진짜 공포’
3) 근로기준법과 청년노동자-노동해방이면서 미적해방인
제4장 비켜선 자리, 불온한 문학의 장소
1. 명랑사회와 문학의 우울
1) 명랑의 불가능성
2) 문학의 장소성
2. 거리와 텍스트에서 불온을 실행시키기
1) ‘불온’이라는 비평언어와 ‘혁명’의 지속-‘문제는 4월 이후다’
2) 거리의 항거, 시를 이행하는 일
3. 감각의 통치 불/가능성
1) 감시사회와 권력/문학의 노이로제
2) ‘만지지 말라’, 오염된/되는 신체와 북한
제5장 불협화음(dissonance)-결론을 대신하여
1. 가면(假面)과 가성(假聲)-‘언어’의 궁리에 대하여
2. 두 개의 유언비어-‘법’과 ‘신의’에 대하여
참고문헌
간행사
제1장 1960년대, 두 죽음의 사이
1. 문학과 역사를 읽는 하나의 방법
2. 불온의 역사-전근대, 식민화, 분단
3. 불온의 시대-데모와 민주주의
4. 논의 대상과 쟁점들
제2장 불온청년, 신원의 정치와 성명전
1. 공안사건 전성시대, ‘북한’이라는 배후
1) 공안의 권력과 불온의 통치술
2) 사상최대의 공안사건과 불온잡지
3) ‘불문율’ 혹은 ‘감각의 양식’-반정부‧반미‧용공‧비도덕
2. 데모의 시대, 혁명과 불온
1) 청년지식인의 신원-“애국자”와 “반국가사범”
2) 주권과 혁명, 그리고 성명전
3) ‘민주주의의 적들’과 ‘지성의 비상사태’
3. 통치의 기술, 법과 서사
1) ‘법의 이름으로’, 파국의 예방과 계엄령
2) 가부장적 체제와 해제하는 권력
3) 권력의 노이로제와 학원의 정상화
4. 옥중기와 진술의 정치학
1) 참회와 갱생, 고백이라는 장치
2) ‘나를 보라’, 남겨진 시간과 글쓰기
3) ‘미해결의 장’, 분열의 기록과 교합되는 언어들
4) 징후적 텍스트와 자기 기술의 테크놀로지-자백, 전향, 옥중기
제3장 빈민대중, 비/가시성과 성원권
1. 법정에 선 문학
1) 필화사건과 검열의 논리-“작품의 명랑화”
2) 비평의 장소들과 재현의 심급-남정현 「분지」 사건
3) 불온시와 정신병-김지하 「오적」 사건
4) 문학과 법
2. 불온의 비가시역
1) ‘빈민대중’이라는 쟁점-반미, 용공, 내셔널리즘
2) 치외법권의 장소들과 불상사
3) 오염과 게토화-‘우리이면서 우리가 아닌’
3. 재현의 문화정치와 가시권의 재구축
1) 비가시성의 가시화-“들어라 코리안들아”
2) 혈육과 구경꾼, 연민의 중지
3) 현실과 픽션, 허물어지는 경계들
4. 사회적 성원권과 파괴적 자기현시, 분서(焚書)와 분신(焚身)
1) 복지국가를 떠도는 ‘무서운 풍자’
2) 불가해한 타자들, 폭동의 시간과 ‘진짜 공포’
3) 근로기준법과 청년노동자-노동해방이면서 미적해방인
제4장 비켜선 자리, 불온한 문학의 장소
1. 명랑사회와 문학의 우울
1) 명랑의 불가능성
2) 문학의 장소성
2. 거리와 텍스트에서 불온을 실행시키기
1) ‘불온’이라는 비평언어와 ‘혁명’의 지속-‘문제는 4월 이후다’
2) 거리의 항거, 시를 이행하는 일
3. 감각의 통치 불/가능성
1) 감시사회와 권력/문학의 노이로제
2) ‘만지지 말라’, 오염된/되는 신체와 북한
제5장 불협화음(dissonance)-결론을 대신하여
1. 가면(假面)과 가성(假聲)-‘언어’의 궁리에 대하여
2. 두 개의 유언비어-‘법’과 ‘신의’에 대하여
참고문헌
간행사
서가브라우징
같은 주제의 책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통합검색
통합검색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내 책장 담기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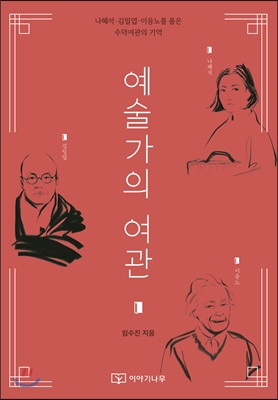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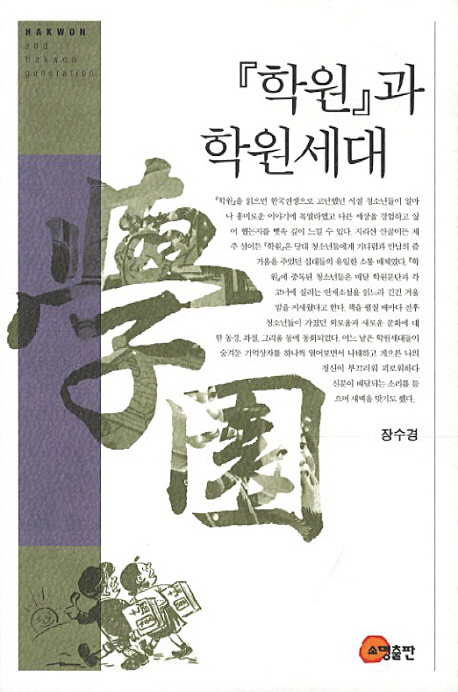


![(큰글)현대수필. 16, 노천명3 : [큰글자도서]](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83/852/08385203.jpg)